[시사경제] 용어정리 (25)
23 Dec 2020 | Economics 시사경제변동환율제
환율이 외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간섭을 않는 제도를 말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이 각국 통화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킨다고 여겨져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금본위 고정환율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각국은 금본위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므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절충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나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사무라이본드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말한다.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독본드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 국제채권이다. 사무라이라는 명칭은 일본을 대표한다고 여겨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원리금의 상환과 지급은 엔화로 계산하며, 이율은 일본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대규모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채가 많다. 일본 채권시장은 발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선진국의 지방정부나 국제금융기관,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주로 발행한다.
사무라이본드와 비교되는 채권으로 양키본드, 불독본드, 아리랑본드 등을 꼽을 수 있다. 양키본드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달러화 표시로 발행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채권이고, 불독본드 런던 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 표시 외채를 지칭한다. 아리랑본드는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원화표시로 발행해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채권이다.
포템킨 경제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구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후 경제상황에 빗대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실한 경제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템킨이라는 용어는 1787년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2세가 크림반도 지역을 시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 총독인 포템킨이 낙후된 상황을 감추기 위해 그녀가 순시하는 주변에 가짜 마을을 만들어 보여주게 된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2013~2014년 러시아에서 7%의 성장률을 보이던 러시아의 경제가 1.3%로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비판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참고: https://www.nytimes.com/2018/06/30/opinion/trumps-potemkin-economy.html
상황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투자자는 미래에 발행회사의 주가가 낮을 경우, 투자금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가가 높을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화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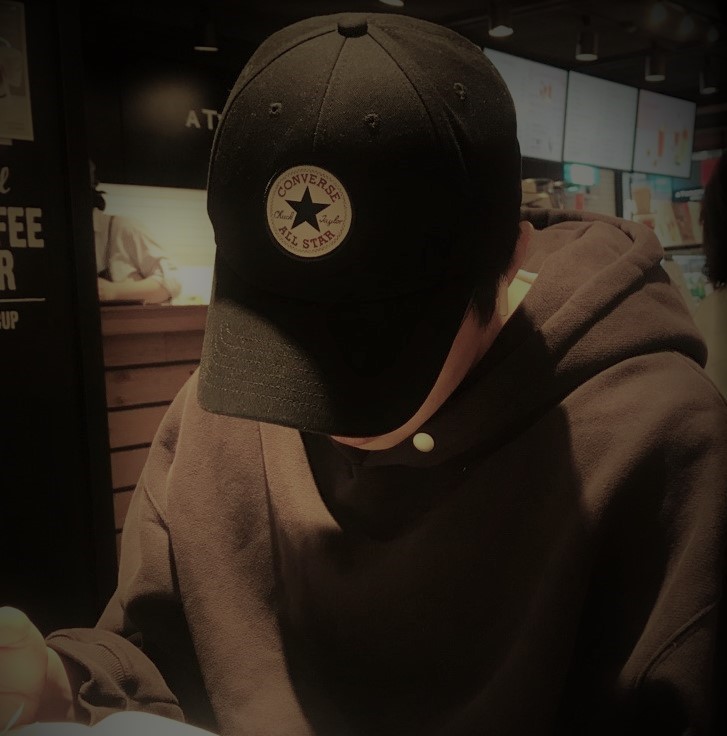
 starfishkenny's Ocean
starfishkenny's Ocean
Comments